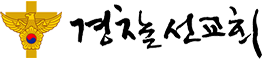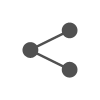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 여사가 1960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달구지에는 가벼운 짚단이 조금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짚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지요.
그녀는 농부의 말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걷는 것. 말 못 하는 짐승이라도 존귀하게 여겼던 농부의 배려심을 닮아가는 것. 배려심이 부족한 지금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주셨습니다.